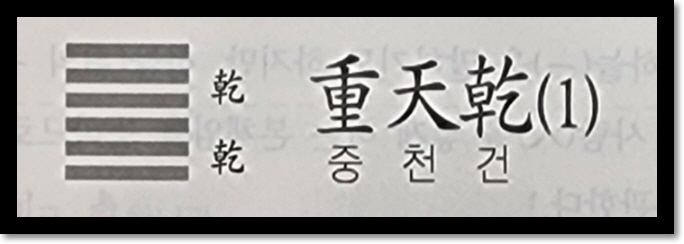
大哉라 乾乎여 剛健中正純粹精也요,
위대하다, 건(乾)이여! 강건(剛健)하고 중정(中正)하고 순수(純粹)함이
정(精)함이요,
【本義】 剛은 以體言이요 健은 兼用言이요 中者는 其行无過不及이요
正者는 其立不偏이니 四者는 乾之德也라 純者는 不雜於陰柔요
粹者는 不雜於邪惡이니 蓋剛健中正之至極이요 而精者는
又純粹之至極也라 或疑乾剛无柔하니 不得言中正者라 하니
不然也라 天地之間에 本一氣之流行而有動靜爾니
以其流行之統體而言이면 則但謂之乾而无所不包矣요
以其動靜分之然後有陰陽剛柔之別也니라.
강(剛)은 체(體)로써 말한 것이요, 건(健)은 용(用)을 겸하여 말한 것이요,
중(中)은 그 행실이 과(過)하거나 불급(不及)함이 없는 것이요,
정(正)은 그 섬이 치우치지 않은 것이니, 네 가지는 건(乾)의 덕(德)이다.
순(純)은 음유(陰柔)에 섞이지 않음이요, 수(粹)는 사악(邪惡)에
섞이지 않음이니, 강건중정(剛健中正)함이 지극한 것이요,
정(精)은 또 순수함이 지극한 것이다. 혹 “건강(乾剛)하기만 하고 유(柔)가
없으니 중정(中正)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의심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천지(天地)의 사이에는 본래 한 기운이 유행(流行)하는데
동(動)과 정(靜)이 있을 뿐이니, 유행(流行)의 통체(統體)를 가지고 말하면
다만 건(乾)이라고만 말하여도 포함되지 않음이 없고, 동(動)과 정(靜)으로
나눈 뒤에야 음(陰)과 양(陽), 강(剛)과 유(柔)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六爻發揮는 旁通情也요,
육효(六爻)로 발휘함은 정(情)에 곡진함이요,
【本義】 旁通은 猶言曲盡이라.
방통(旁通)은 곡진(曲盡)하다는 말과 같다.
時乘六龍하여 以御天也니 雲行雨施라 天下平也라.
때로 육룡(六龍)을 타고 하늘을 나니, 구름이 다니고 비가 내려 천하가 화평하다.
【本義】 言聖人時乘六龍以御天이면 則如天之雲行雨施而天下平也라.
성인(聖人)이 때로 육룡(六龍)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다니고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 천하가 화평함을 말한 것이다.
○ 此는 第五節이니 復申首章之意하니라.
○ 이는 제5절(節)이니, 머릿 장(章)의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p25~
君子以成德爲行하나니 日可見之行也라 潛之爲言也는
隱而未見(현)하며 行而未成이라 是以君子弗用也하나니라.
군자(君子)는 덕(德)을 이룸을 행실로 삼으니, 날로 볼 수 있는 것이 행실이다.
잠(潛)이란 말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며 행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君子)가 쓰지 않는 것이다.
【本義】 成德은 已成之德也라 初九는 固成德이나 但其行未可見爾라.
성덕(成德)은 이미 이루어진 덕(德)이다. 초구(初九)는 진실로 이루어진
덕(德)이나 다만 그 행실이 아직 드러날 수 없을 뿐이다.
君子學以聚之하고 問以辨之하며 寬以居之하고 仁以行之하나니
易曰見龍在田利見大人이라 하니 君德也라.
군자(君子)가 배워서 지식을 모으고 물어서 분변(分辨)하며 너그러움으로
거하고 인(仁)으로써 행하나니, 역(易)에 이르기를 ‘나타난 용(龍)이 밭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만나봄이 이롭다’고 하니, 이는 군자의 덕(德)인 것이다.
【本義】 蓋由四者하여 以成大人之德이라 再言君德은 以深明九二之爲大人也라.
네 가지로 말미암아 大人의 德을 이룬다. ‘군주의 德’이라고 두 번 말한 것은
九二가 大人이 됨을 깊이 밝힌 것이다.
九三은 重剛而不中하여 上不在天하며 下不在田이라 故로 乾乾하여
因其時而?하면 雖危나 无咎矣리라.
구삼(九三)은 거듭된 강(剛)이고 중(中)하지 못하여 위로는 하늘에 있지 않고
아래로는 밭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힘쓰고 힘써서 때에 따라 두려워하면
비록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을 것이다.
【本義】 重剛은 謂陽爻陽位라.
중강(重剛)이라 함은 양효(陽爻)가 양위(陽位)에 있음을 이른다.
九四는 重剛而不中하여 上不在天하며 下不在田하며 中不在人이라
故로 或之하니 或之者는 疑之也니 故로 无咎니라.
구사(九四)는 거듭된 강(剛)이고 중(中)이 되지 못하여 위로는 하늘에 있지 않고,
아래로는 지상에 있지 않고, 가운데로는 인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혹(或)이라고 하였으니, 혹(或)이란 의심하는 말이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本義】 九四는 非重剛이니 重字는 疑衍이라 在人은 謂三이요 或者는
隨時而未定也라.
구사(九四)는 중강(重剛)이 아니니, 중자(重字)는 의심컨대 연문(衍文)인 듯하다.
인간에 있다는 것은 삼(三)을 말함이요, 혹(或)이란 때에 따르고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夫大人者는 與天地合其德하며 與日月合其明하며 與四時合其序하며
與鬼神合其吉凶하여 先天而天弗違하며 後天而奉天時하나니
天且弗違온 而況於人乎며 況於鬼神乎여.
무릇 대인(大人)이란 천지(天地)와 그 덕(德)이 합하며, 일월(日月)과
그 밝음이 합하며, 사시(四時)와 그 질서가 합하며, 귀신(鬼神)과
그 길흉(吉凶)이 합하여, 하늘보다 먼저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으며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천시(天時)를 받드나니, 하늘도 어기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며, 귀신에게 있어서랴.
【本義】 大人은 卽釋爻辭所利見之大人也니 有是德而當其位라야
乃可以當之라 人與天地鬼神이 本无二理로되 特蔽於有我之私라
是以로 梏於形體而不能相通하나니 大人은 无私하여 以道爲體하니
曾何彼此先後之可言哉리오 先天不違는 謂意之所爲 默與道契요
後天奉天은 謂知理如是하여 奉而行之라 回紇이
謂郭子儀曰 卜者言此行에 當見一大人而還이라 하더니
其占이 蓋與此合이라 하니 若子儀者는 雖未及乎夫子之所論이나
然其至公无我하니 亦可謂當時之大人矣라.
대인(大人)은 효사(爻辭)에 ‘이견대인(利見大人)’의 대인(大人)을 해석한 것이니,
이 덕(德)이 있으면서 이런 지위에 당하여야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사람은 천지(天地), 귀신(鬼神)과는 본래 두 이치가 없으나 다만 유아(有我)의
사욕에 가리워질 뿐이다. 이 때문에 형체에 질곡되어 서로 통하지 못하니,
대인(大人)은 사욕이 없어 도(道)로서 본체를 삼으니,
어찌 피차(彼此)와 선후(先後)를 말할 수 있겠는가. ‘선천불위(先天不違)’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묵묵히 도(道)와 합함을 말한 것이고,
‘후천봉천(後天奉天)’은 이치가 이와 같음을 알아 받들어 행함을 말한다.
회흘(回紇)이 곽자의(郭子儀)를 두고 말하기를, “점치는 이가 이번 걸음에
한 대인(大人)을 만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더니,
그 점(占)이 이와 부합했다.” 하였으니, 곽자의(郭子儀)와 같은 사람은 비록
공자(孔子)가 말씀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극히 공정하고 사욕이 없었으니,
역시 당시의 대인(大人)이라 일컬을 수 있다.
亢之爲言也는 知進而不知退하며 知存而不知亡하며 知得而不知喪이니,
항(亢)이란 말은 나아감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르며, 보존함만 알고 망할 줄을
모르며, 얻음만 알고 잃을 줄을 모르는 것이니,
【本義】 所以動而有悔也라.
이 때문에 동(動)하면 뉘우침이 있는 것이다.
其唯聖人乎아 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 其唯聖人乎인저.
오직 성인(聖人)인가? 진퇴(進退)와 존망(存亡)의 이치를 알아 정도(正道)를
잃지 않는 이는 오직 성인(聖人)뿐일 것이다.
【本義】 知其理勢如是而處之以道면 則不至於有悔矣니
固非計私以避害者也라 再言其唯聖人乎는 始若設問而卒自應之也라.
이치〔理〕와 형세〔勢〕가 이와 같음을 알고 도(道)로써 대처하면 뉘우침이
있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니, 진실로 사사로움을 헤아려서 해(害)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기유성인호(其唯聖人乎)’라고 두 번 말한 것은
처음에는 가설하여 묻는 것처럼 하고, 끝에는 스스로 응답한 것이다.
○ 此는 第六節이니 復申第二第三第四節之意하니라.
○ 이는 제(第) 6절(節)이니 제(第) 2절(節), 제(第) 3절(節), 제(第) 4절(節)의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周易 上經' 카테고리의 다른 글
| 周易(上經)~重地坤卦(2)~2 (2) | 2022.12.13 |
|---|---|
| 周易(上經)~重地坤卦(2)~1 (2) | 2022.12.07 |
| 周易(上經)~重天乾卦(1)~5 (2) | 2022.11.27 |
| 周易(上經)~重天乾卦(1)~4 (2) | 2022.11.20 |
| 周易(上經)~重天乾卦(1)~3 (1) | 2022.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