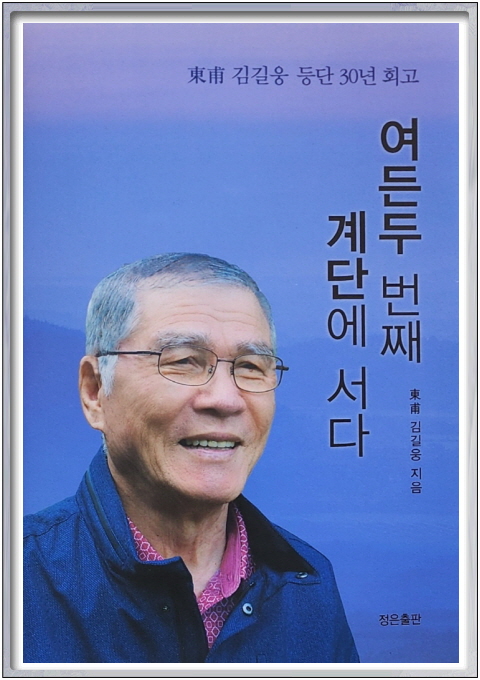권말기(卷末記)
김길웅, 칼럼니스트
본문 뒤에 내용의 대강을 적은 글이 권말기다.
후기 또는 발문이라고 하는데 작품집의 경우, 책을 상재하는
이의 취향에 따라 작품 평, 작품 해설이라고도 한다.
내가 권말기를 처음으로 쓴 게 20년이 넘었더니.
그새 50여 권에 이를 것 같다. 문학동인, 강의하는 글방 회원
또 이런저런 과거의 인연들이다. 청탁하면 마다할 수 없어 쓰는
형편이다. 좁은 지역이라 청을 거스르지 못한다.
문제는 남의 작품을 평하기가 쉽지 않은 데 있다.
작품을 어떤 기준에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여간 가탈스러운
일이 아니다. 뭣한 말로 도가 됐든 개가 됐든 작가의 의도를
꿰뚫어 봐야 하므로 오만 신경이 다 쓰인다.
밑바닥에 흐르는 주제를 짚어내면서 행간까지 읽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일별했다 낭패 사는 게 타자의 작품을 풀어내는 일이다.
청탁받고 나면 사나흘을 끙끙 앓는다. 눈앞을 산처럼 막아 나서는 게
발문의 제목이다. 가위 압박 수준이다. 전체를 함축해 함의(含意)로
담아낼 어휘와 수식이 조합된 깔끔한 단문 구조의 탄생을 기다린다.
옥상에 올라 산을 바라보다 굽이치는 바다를 보다 하늘을 우러른다.
금기가 있다. 언급한 내용을 다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니와 평자의 양식 문제로 민감한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 앞에 쓴 걸 들춰 보지 않는다.
내 것에서 끄집어내 재탕하는 것도 모방, 좋은 발문을 방해하는 훼방꾼이다.
한 여류가 발문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작품 평을 받아 본 게 처음이란다. 내 발문보다 그 ‘처음’에 감격했을 것이다.
“독자들이 선생님의 해설만 읽었답디다.” 듣기에 싫지 않았다.
칭찬엔 나도 춤을 추는 모양이다.
이런 긴 글을 남긴 여류도 있다. “내 글이 그처럼 황홀한 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회장님이 쓰신 글과 제 글은 갭이 너무 많아
몸 둘 바를 모르겠고, 부끄럽습니다.
가려운 곳을 너무나 정확히 긁어 주셔서 시원도 하지만, 오싹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가벗은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요.
회장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자꾸 나려 하지만 그건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남편의 영전에 바치면서 소리 내어 울겠습니다.”
순간에 나도 울컥했다.
얼마 전, 한 원로 문인에게서 청탁을 받았다.
동시와 시조를 겸하는 분인데 학교 선배라 잠시 말을 끊었다 거뒀다.
희수기념시조집이라, 몇 날 며칠 공들여 썼다.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길어지기도 하는 게 글이라 A4 용지 15매가 됐다.
장문이다. 메일로 보냈더니 꼼꼼히 읽었다며 답이 왔다.
“발문을 받아 읽고 앉으니, 장문의 발문이 오히려 시향처럼 진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어쩌면 나의 분신과 같은 문장이 태어났는지 놀랍습니다.
그중 저의 인상에 관한 것인데, ‘왕고집’입니다. 화자와 비슷하지만,
당숙님처럼 왕고집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캐릭터에 붙여 놓으니,
저도 왕고집이네요….”
발문을 써달라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왕 쓸 것이면, 좋은 글이 되게 독서의 터수를 늘려야겠다.
썼던 걸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