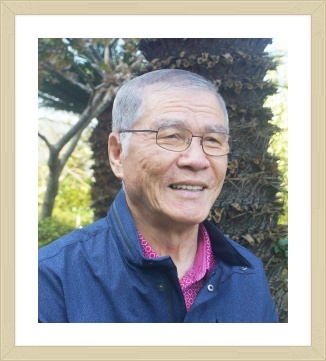
고치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바람인가 보다 했다.
나를 휘청하게, 붕 뜨게 한 게 바람인가 보다 했다.
간간이 흔들어 깨우거나 잠들게 한 것이 바람인가 보다 했다.
밖으로 나가게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도,
돌아오는 길 그 문을 열어준 것도 분명 바람인가 보다 했다.
여태 내가 바람에 온전히 지배됐거나 그것이 장악하는 한정된
둘레에만 머무르며 고분고분 순종해 온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바람은 길을 지나갈 뿐 방향이 아니었다.
뒤늦게 바람이 내게 어떤 영향도 끼친 적이 없다는 사실 앞에 경악했다.
어느 가을날 바람에게 한 장의 편지를 쓰고 있었다.
오랜만의 손편지였다.
“나를 흐르게 한 그대, 나를 나고 들게 한 그대가 있어 나는 존재로 틀고
앉았거든. 흐르고 수시로 나고 들어야 삶이란 걸 알게 해 준 그대에게
무조건 찬사를 쏟아내고 싶어. 그대가 떠밀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휩쓸고 말았거나 떠밀리다 어느 하구에 불시착해 오던 길로
역주행했을지도 몰라….
그 순간, 나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가빴어.
그대에게 떠밀리는 길에서 낡은 시절의 혼돈과 흐트러진 사유에서
떠나려 뭍에 끌어올린 낡고 작은 배를 고쳐 띄우고, 노 젓자 한 것이지.
팔뚝의 근육이 불끈거렸어. 그때였지.
나는 나를 버리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거든.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걸 알았고, 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따뜻한
웃음을 띠는 미덕을 배웠거든.”
때마침 지나던 돌개바람에 편지를 날리고 말아,
띄워 보내지 못한 편지가 돼 버렸다. 지금쯤 어느 풀 무성한 언덕에
작은 깃발로 나부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벌겋게 슨 녹을 털어내고,
갈라진 틈을 메우고, 커가는 구멍을 때우고 고장 난 소품들을 고쳐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나를 세상의 시간과 맞추는
일에 소진했다고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
땀을 쏟으며 낯선 길을 걷고 있었다.
도시의 모퉁이에서 우연히 맨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았다.
물이 새는 걸 방치할 수는 없다. 누군가 고치는 손이 있어야 한다.
일하는 손이었다. 그릇된 걸 바로잡는 손이 있어야 사람의 세상이다.
오자투성이 글을 바로잡지 않으면 좋은 책이 될 수 없다.
작가의 영혼이 떠나 버린다. 꼼꼼히 고쳐야 하는 건 책무다.
완성해야 울림이 있어 작품이다.
불면의 밤에 독작했던 적이 있다.
술로 잠을 부르는 고약한 습관이었다.
한두 번이 댓 번으로 횟수가 늘면서 술의 양도 늘었다.
강제하는 잠은 숙면에 못 닿았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 술을
버리기로 했다. 맨정신으로 해 볼 테면 해라 독하게 내몰았다.
어느 날 머리가 맑은 아침을 맞았다. 슬금슬금 술을 제압했다.
고친 뒤는 평화였다.
저녁이다. 주방에 가 앉는다.
삼겹살을 굽는 냄새가 진동해 몇 번인가 끓던 침이 목을 넘는다.
식탁엔 벌써 싱싱한 상추가 올라왔다. 쌈으로 포식해야겠다.
배가 든든하게 먹어 두자.
그냥 방치한 것들, 사소해도 일이다.
이후, 이런저런 고치는 노고를 떠안아야 한다.

'동보 김길웅 시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웅은 초년에 고생했다 (3) | 2024.05.17 |
|---|---|
| 해 뜰 날 (3) | 2024.05.10 |
| '영웅'은 연습벌레 (3) | 2024.04.26 |
| 역시 '임영웅' (1) | 2024.04.19 |
| 슬럼프 (1) | 2024.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