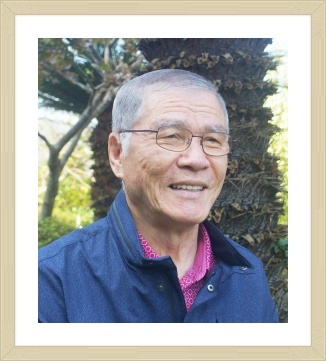
가라지
김길웅, 칼럼니스트
조(粟)를 쏙 빼닮다.
하지만 거둬들일 때가 되면 속이 꽉 찬 알곡들은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이는데, 이것들은 말라빠져 꼿꼿이 머리를 하늘로 쳐든다.
가라지다.
이들은 낫으로 베어 묶여 불살라지고 알곡들만 곳간에 들인다.
최후의 선택이다.
신약 성서 마태복음을 보면 13장 24~30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온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 천국으로
인도해 들인다. 가라지와 같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알곡처럼 비슷해 보여도 언젠가는 심판대에 서게 됨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알곡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의적(寓意的)으로 빗대었다. 성서 속의 가라지는 마귀다.
마귀이므로 반드시 안에 숨겼던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흉측한
발톱을 치켜세운다는 얘기다.
어렸을 적, 조밭에서 김매던 때를 떠올린다.
조가 한창 자랄 때 제일 힘든 게 조와 가라지를 가리는 눈어림이었다.
녀석은 잡풀인 게 뚜렷한 바랭이나 쇠비름 같은 여느 잡풀하고도 달랐다.
암만 봐도 줄기와 잎이 영락없이 조를 닮았다.
하긴 가라지를 그렇게 잘 골라내던 어머니도 실수를 안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가라지는 조와 혹사(酷似)다. 경험으로 훈련된 어머니의 눈을
피해 조 속에 숨었던 놈들도 가을걷이를 목전에 두고 뽑혔다.
가을 걷이 직전에도 뽑았다. 기어이 그 마지막 작업에 걸려들고 만다.
잎과 줄기하고는 달라 이삭을 보면 한눈에 구별이 됐다. 알곡의 무게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가. 농군의 눈을 속여 왔지만 끝내 들켜 버린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도처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수가 적지 않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 개인의 이익만을 탐하는 이기적인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일을 함에 약아빠지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
주고받는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같아 보이나 실제는 전혀 다른 사이비,
조밭의 가라지다. 가라지는 사회 각계각층에 존재한다. 비리, 불법, 분쟁,
시비, 야합,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지위에서 활개 치며
승승장구한다 해도 그는 단지 알곡을 기대할 수 없는 가라지일 뿐이다.
기대할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그런 자는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존재 자체가 해악이고 폐해다. 사이비이기 때문이다.
그 가라지가 내 글쓰기 속에 깊숙이 틀어 앉았다.
한글 문장 속의 무수한 우리말 어휘들, 수많은 말들 속에 버티고 앉은
가라지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 김매던 그때처럼 아무리 눈을 번득이고
머리를 짜도 어휘들이 다 조로만 보일 뿐이다.
내 눈에 가라지로 보이는 사이비 언어를 적발하고 집어 내지 못하는
청맹과니의 안타까움, 이 어릿광대 같은 재능의 한계가 답답하다.
내 언어라 했던 것이 내 언어가 아니었던 것, 마음과 체온과 속정이
담긴 내 영혼의 언어, 체질이 되고 육화한 나만의 말을 찾아내고 싶다.
수필 속에서, 또 시 속에서 내 언어가 아닌, 내 언어로 위장했던
가라지들을 솎아내는 일, 요즘 내 문학이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아픔이다.
새로운 방황으로 신산해도 이를 즐겨야겠다.

'동보 김길웅 시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맹탕 (10) | 2024.10.18 |
|---|---|
| 가장 아름다운 낱말 (1) | 2024.10.11 |
| 가을이 오는 길 (2) | 2024.09.27 |
| 구지뽕 조청 (0) | 2024.09.20 |
| 영웅이 영웅을 뛰어넘다 (2) | 2024.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