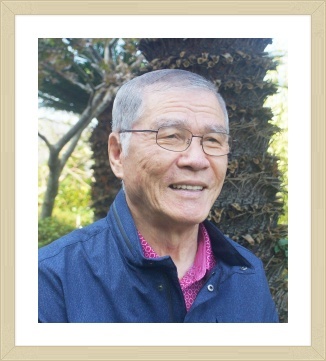
7월은
김길웅 칼럼니스트
저벽저벽 둔중한 발걸음 소리에 직감했던 일이다.
7월은 포동포동 살 오르기 시작한 6월을 단숨에 밀어제치고,
두툼한 몸뚱이로 와 무턱대고 덤벼든다. 일 년을 딱히 두 동강
내놓고는 무턱대고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의 시작점이다.
여름의 한복판, 6월 첫 더위에 임전 태세를 시험한다고 송알송알
맺히던 땀방울이 7월엔 냇물로 줄줄 흘러내린다.
유난히 땀이 많은 나로선 8월까지 악전고투해야 하는
고난의 한때에 꼼짝없이 갇혀 버린다. 에어컨 바람마저 싫어하니
전전긍긍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7월은 애초에 넉넉한 가슴을 지녔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게 초록을 선사하는 걸 잊지 않았다.
찜통더위에 집 안에 박혀 있을 게 뭔가.
눈길이 이르는 데마다 녹음 짙은 크고 작은 숲이 지천이다.
폭염경보 속 불더위에도 우리 주변엔 초록으로 휘감은 풍성한
숲들이 있고, 숲엔 바람이 산다.
녹음과 바람, 우리에게 넉넉한 베풂이 있어 7월은 더위의
기승에도 살 만한 계절이다.
덥다, 덥다 투덜대지 말고 가까운 숲 그늘에 앉아,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고장 전설이 주절이주절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이육사의 <청포도> 첫머리라도 낭송할 일이다.
해맑은 목소리에 뜻밖에 7월의 숲속에서,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하고 이어 갈지
누가 알랴. 마음이 7월을 품으면 될 것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초록에 물들어 푸르다.
푸르러 한빛으로 싱그럽다.
7월은 천지를 뒤덮은 녹음으로 가슴 벌려 허한
구석구석을 한가득 품어준다.
느긋한 여유와 널널한 포용의 달답다.
6월 하순께 장마가 왔다.
까딱하다 7월 한 달 비가 걷히지 않으리라는 예보도 들린다.
장마가 오래 계속되면 비가 숲을 이뤄 장림(長霖)이다.
후텁지근한데 눅눅하면 견뎌내기 힘들다.
여름 손님은 호랑이라지만 대수랴, 반바지 민소매 바람으로
바람 살랑이는 숲속에 한 자리 틀고 들앉아 명상에 들면
좋을 것이다. 홑적삼에 바지 아니라도 조선의 한량
코푸레면 어떤가.
도인이 따로 있나, 푸른 숲에 앉아 마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게지. 이쯤애서 흐르는 땀도 잠시 들이게 될 것이니.
고단한 일상을 구실 삼아 늙은 나무등걸에 등 대고 앉아
아시잠이나마 깜빡 붙이면 덤벼들던 피로가 순식간에 슬어질
것을. 간간이 숲 그늘을 흔들고 지나는 한 떨기 건들바람에
몸도 가슬가슬해 있을 것이며.
7월은 초·중복이 들어 있는 달이다. 예부터 복날에 닭을 고아
먹어 여름을 났다. 몇 마리라더라, 나라 안의 닭들이 떼 죽임을
당하는 달이다. 또 하나, 보신탕으로 한 차례 갈등을 겪는다.
개가 반려로 대우받는 세상이라 생판 달라졌으나 즐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쉽지 않아도 실마리를 잡아야 할 일이다.
7월은 왕성한 생명의 계절인데 살생의 한철이기도 하다.
이 웬 모순의 극단에 있어 머쓱하다.
나는 불심 깊은 아내 눈치를 보다 좋아하던 음식도 내려놓았다.
7월은 산지사방이 초록. 나무들 물 퍼 올리는 소리에 힘이 불끈 솟는다.





